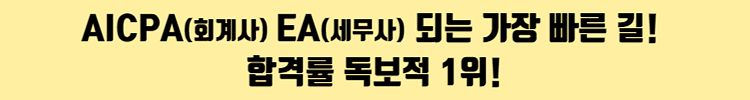프랑스 샴페인(Champagne, 샹파뉴) 시골 마을에서의 하룻밤
저 푸른 포도밭 아래 그림같은 집
2018 프랑스 여행 <4> 샴페인 시골마을에서의 하룻밤
샹파뉴의 금싸라기 땅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
샴페인의 작은 마을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의 샹파뉴바라동미쇼데(Champagne Baradon Michaudet) B&B. 창문이 보이는 방(Green Room)엔 사우나도 설치되어 있다.
이번 여행은 프랑스의 샴페인(Champagne, 프랑스어 발음은 '샹파뉴') 산지와 독일 리슬링 와인 산지인 모젤(Mosel)을 자동차로 둘러 보는 것이었다. 불어를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로 배웠고, 대학 때 1년 또 공부했지만 단어 몇개만 떠오를 뿐, 순 초보인 필자와 초급 독일어를 구사하는 친구하고의 여행이었다. 샤를르드골 공항에서 바로 차를 대여하고 샴페인으로 향했다.
샴페인은 파리에서 당일코스 여행지로 인기 있다. 샴페인 지역의 수도 랭스(Reims)까지 약 150km 떨어져있는데, 자동차로는 90분, 고속열차(떼제베, TGV)로는 4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명품 샴페인 하우스 태탕제(Taittinger)에서 투어와 시음회를 예약해놓고, 하루를 묵을 계획이었다. 방은 뉴욕에서 예약했다. 와인잡지 디캔터(Decanter)에서 추천한 자그마한 B&B(Bed & Breakfast)인데 웹사이트를 보니 사진도 근사했고, 숙박료도 저렴했다.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
웹사이트 메일로 문의를 했는데, 답장이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중년 여인이 영어를 못한다고 했다. 둘이서 버벅거리며 원, 투, 쓰리로 날짜를 말하다가 포기하고, 이메일을 썼다. 이럴 때 구글 번역기가 동시통역관이었다. 영어로 we would like to reserve a room...을 치니, 불어로 nous aimerions réserver une chambre가 떴다! 답장도 바로 왔다. 번역기에 넣으니, 즉시 영문 해석이 떴다. 샹파뉴 바라동 미쇼데(Champagne Baradon Michaudet)에서 1박을 예약하는데 성공했다. 구글에 감사.
태탕제가 있는 랭스(Reims)에서 숙소 샹파뉴 바랑동미쇼데가 자리한 마을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까지는 40여분 거리엔데, 길을 잘못 들어서 1시간 쯤은 걸렸다. 포르투갈처럼 프랑스가 방사선 도로라더니 로터리(roundabout)에서 길이 4-8개로 갈라지는데, 아이폰 구글 내비의 가이드는 표지없는 프랑스 도로 이름을 계속 외치고 있었다.
두번째 출구, 세번째 출구조차 헷살려서 번번이 돌아가며 운전자 친구와 논쟁하다가 가슴을 여러번 쓸었다. 내비는 디렉션을 바꾸면서 먼길에서 유턴하게 만들었다. 오래 전 회사 동료가 가족과 자동차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디렉션 때문에 무수히 싸웠다고 푸념했던 것이 이해되었다.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의 포도원. 명품 샴페인 크루그(Krug)와 살롱(Salon)이 이곳 청포도(샤도네이) 100%로 블랑드블랑 샴페인을 만들고 있다.
마침내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펼쳐지고, 산 아래로 자그마한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수확기가 지났을 텐데 알알이 박힌 청포도송이들이 줄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육사의 시 '청포도'가 떠올랐다. 피노 누아(Pinot Noir), 피노 무니에(Pinot Meunier)와 함께 샴페인 제조에 쓰이는 청포도(white grapes) 샤도네이(Chardonnay)다. 샤도네이는 프레시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텍스쳐, 피노누아는 강렬한 바디와 풍성한 맛, 피노 무니에는 과일과 꽃향을 더해준다.
원래 와인 만드는 포도는 맛이 없다고 들었다.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다가 수박서리하듯 바닥에 떨어진 포도 한알을 따서 입안에 넣으니, 사르르르 새콤달콤한 즙이 흘렀다. 맛없다는 말은 아마도 와인용 포도를 과일처럼 서리할 이들을 따돌리기위해서일까? 샴페인의 샤도네이는 한관 사다 먹고 싶을 정도였다.

르메닐쉬로제의 포도밭은 백악질 토양 덕에 100% 1등급(그랑 크뤼)로 랭크된다.
샴페인 지역의 토양은 석회암의 한 종류인 백악질(chalk) 토양이다. 1천만년 전 지진으로 바다에 잠겼던 생물의 잔해가 오랜 세월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질로 물이 잘 빠지고, 흡수도 잘된다. 석회질에 함유된 탄산칼륨은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은 PH농도를 유지해준다는, 금싸라기 땅이다.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의 벽이 쳐진 크루그(Krug) 샤도네이 포도밭과 1천달러 샴페인.
르메닐쉬로제는 샴페인 지역에서도 1등급(그랑 크뤼) 샤도네이 생산지로 유명한 코테 데 블랑(Côte des Blancs, 하얀 언덕)에 자리한 마을로 아비즈(Avize), 슐리(Chouilly), 크라망(Cramant), 그리고 오제(Oger)가 이에 속한다. 이 지역은 95% 샤도네이를 심으며, 백포도로 만든 백샴페인, 블랑드블랑(Blanc de Blancs)을 생산한다.
'샴페인의 왕(King of Champagne)'으로 불리우는 크루그(Krug)와 컬트 샴페인 살롱(Salon)이 르메닐쉬로제의 샤도네이로 샴페인을 빚는다. 크루그는 포도밭 'Clos du Mesnil'에 벽까지 두르고 철통 수비를 하며 샴페인이 될 샤도네이를 기르고 있었다.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메종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멀리서 사진 촬영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클로뒤메닐이 보이는 골목길 Allée Clos du Mesnil을 알려주어 언덕에서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 크루그의 클로뒤메닐(Clos du Mesnil)은 바로 이 1.84헥타르의 포도밭에서 재배한 샤도네이로 만든다. 크루그의 클로뒤메닐 한병은 1천달러에 달하며, 살롱의 르 메닐(Salon's Le Mesnil)은 400달러 내외.
르메닐쉬로제(Le Mesnil sur Oger)
샴페인의 9월 햇빛은 포근하고, 정겨웠다. 샴페인 이름을 딴 샤토(성)급의 주택들이 스쳐지나가고, 이쁘장한 담쟁이와 창가의 꽃들이 상냥하게 여행자들을 반겨주었다. 우리의 숙소는 말 그대로 프렌치 컨트리풍의 하우스였다. 알고 보니 B&B 주인장 커플(쟌느와 쟝 미쇼데)은 바라동 미쇼데라는 이름의 샴페인을 제조하며 방 4개와 별당에 B&B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형 샴페인 메이커들은 자기네 포도밭 외에도 포도를 구입해서 샴페인을 제조하며, 시골의 자그마한 포도밭 주인들은 자기네 포도로 샴페인을 만들기도 한다.

샹파뉴바랑동미쇼데 B&B의 박물관급 샴페인 인테리어.
나의 키만한 바라동 미쇼데 샴페인 병이 게스트를 환영했다. 거실에서 식당, 복도까지 옛날 샴페인 제조 기구들과 샴페인 테마 인테리어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미니 박물관같았다. 우리의 방은 2층의 그린룸으로 창문을 여니 언덕의 포도원이 풍경이 들어왔다. 90유로, 100달러짜리 룸인데도 목욕탕에는 사우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아침식사도 물론 포함됐다. 파리에선 두배를 내도 옷장만한 방일 터이다. 와인 농장을 배경으로 한 에릭 로메르(Éric Rohmer)의 '가을 이야기(A Tale of Autumn)' 속에 들어간 착각이 들었다. 게다가 숙박 손님을 우리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에는 크롸쌍, 햄을 바랑동 미쇼데 샴페인 반병(Cuvee Tradition, 9유로)짜리를 곁들였다. 샴페인은 '축배의 술'로 알려졌지만, 루이 14세는 매 끼니마다 샴페인을 곁들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일 아침, 배우 브리짓 바르도는 오후에 기분 전환으로 마신다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샴페인은 사실 애피타이저부터 메인디쉬, 디저트까지 고루 잘 어울리는 술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이 작은 집에서 만드는 샴페인은 맛도 좋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다. 여행 중 마실 요량으로 두병(로제 & 2006 르메닐 빈티지)을 구입했다. 영어를 못하는 쟌느, 쟝 부부와 불어를 못하는 우리는 손짓,발짓으로, 눈치코치로 소통했다. http://www.champagne-baradon-michaudet.fr

기찻길 옆 식당 라 가르(La Gare)에서의 점심식사
점심은 쟌느가 추천해준 '라 가르(La Gare, 역)'으로 갔다. 기찻길 옆에 자리한 라 가르는 빨간색 테마로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한 식당이다. 그런데, 영어 메뉴도 없고, 웨이터도 영어를 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옆 테이블을 컨닝하게 된다. 샴페인 두잔, 그리고, 생선요리, 애피타이저는 옆 테이블 여인과 같은 것으로... 매혹적인 디저트는 포도가 올라간 타르트였는데, 환상적이었다. 혹시나 포도밭에 떨어진 샤도네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메뉴가 애피타이저 (앙트레, Les Entrees), 메인코스(플라 Les Plats), 디저트(Les Desserts)로 나뉘어 있다. 미국에서 메인코스로 쓰이는 '앙트레'가 프랑스 본토에선 애피타이저. 들어간다(enter)라는 뜻이니, 스타터가 맞을 것이다. 애피타이저로 치즈 파이(Le Feuillete de Maroiles), 메인디쉬로 화이트 버터 생선(Le Poisson selon L'arrivage au Beurre blanc), 스테이크와 프렌치프라이(La Piece du Boucher, Bearnaise, Frites), 그리고 디저트로는 포도파이(La Tarte aux Raisins)를 시켰다.
샹파뉴에서 식사에 샴페인이 빠질 수 없다. 지모네-고네(Gimonnet-Gonet Grand Cru Blanc de Blanc)와 페르투아-모리세 로제(Pertois-Moriset Grand Cru Rose)를 주문했는데, 온도, 버블, 상큼함이 3박자가 되어 점심식사를 개운하게 만들어주었다.
http://www.lagarelemesnil.com

지모네-고네(Gimonnet-Gonet) 하우스와 시음회
식당에서 마신 블랑 드 블랑 샴페인 지모네-고네(Gimonnet-Gonet)가 좋아서 찾아보니, 우리 숙소 건너편에 있는 샴페인 하우스였다. 미국에선 구하기 힘든 샴페인이지만, 마셔본 명품 샴페인들에 비해 손색이 없다. 지모네-고네로 찾아가니 와인메이커들인듯한 모자가 일을 하다가 나와 시음 준비를 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퉁명스러운 청년은 우리나라 농촌 총각을 연상시켰다. 가업을 계승하려니, 도시로 못나간 것에 대한 불만이 서린 얼굴일까? 사연이 있겠지. 조금 후에 식당 라 가르에서 건너 테이블에 있던 여행자 두 커플도 테이스팅하러 왔다. 로컬 식당에서 동네 샴페인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한 것. http://www.champagne-gimonnet-gonet.com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니 "제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르메닐쉬로제의 '개조심' 경고.
파란 하늘 아래 포도밭이 펼쳐진 르메닐쉬로제, 이름은 어렵지만 정겨운 마을이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뉴욕의 지하철 소음과 사이렌 소리가 없는 프랑스의 시골. 교회 종소리에 깨고, 샴페인에 취하고...
샹파뉴의 르메닐드로제는 '인생이 축제'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었다.
“무엇이든 너무 많은 것은 나쁘다, 하지만 과도의 샴페인은 정말 옳다."
-F. 스캇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작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샹파뉴 태탕제(Taittinger) 카브 투어
*샴페인 도시 랭스 노트르담 대성당, 미소짓는 천사를 만나다
*나폴레옹 다녀간 샤토에서의 하룻밤 Chateau de Courcelles
-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Napa Valley 에서 포도를 따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맛없는 포도주로 만들까? 생각했었어요^^ 몇년전 보았던 " You will be my Son " 영화가 떠오르네요.
-
감사합니다. 샤도네이 와인 한병과 포도 한근 중 택하라면 전 과일입니다^^ 독일 모젤강의 리슬링 포도와 피노누아 맛도 보았는데, 넘 맛있더라구요. 포도 팔기보다는 와인을 만드는 것이 보관도 좋고, 큰 수익이 되겠지요. 보르도 와이너리 이야기 "You Will Be My Son"으로 와인 메이커들의 삶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https://www.nyculturebeat.com/index.php?document_srl=2907412&mid=Film







 사진작가 진영미의 이집트 여행 (2)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는 ...
사진작가 진영미의 이집트 여행 (2)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