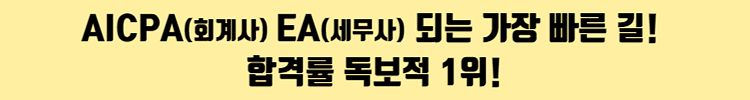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80)
- 강익중/詩 아닌 詩(80)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8)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345) 강익중: 1984년,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버스 여행
詩 아닌 詩 <6> 그레이하운드 버스
1984년,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버스 여행
 Ik-Joong Kang
Ik-Joong Kang
뉴욕에서 멀지 않은 필라델피아에 대학 동창이 살고 있다. 특별히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오늘 아침 집 근처 차이나타운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왕복 4시간이라 밀린 빨래를 하듯 쌓아둔 생각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사실 이 글을 이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쓰고 있다. 시간에서의 앞과 뒤는 우리가 정해 놓은 숫자, 과거와 미래도 결국 한 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니 버스 안 특유의 매캐한 냄새와 함께 오래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
‘와! 엄청 싸다! 자판기 콜라값이 35센트야!’
아이다호 감자로 유명한 보이지(Boise) 정거장에서였다. 1984년 봄의 일이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뉴욕에서 버스로 시애틀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모두들 말렸다. 심지어 버스 매표소 아주머니도 “엄청 멀어! 왕복 일주일이 넘는데 괜찮겠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승차권을 건내주었다.
맨해튼 42스트릿에서 떠난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목적지 시애틀까지 모두 35번 정거장에 섰다. 워낙 먼 거리이다 보니 4~5시간 정도 주행을 한 후 매번 새로운 운전사로 바뀌었다. 뉴욕을 떠난 지 이틀 후, 솔트레이크 근처의 소금 호수를 지나갔다. ‘무슨 호수가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네.’ 나중에 찾아보니 제주도 크기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해가 저물 무렵 들판에 붓으로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저 멀리에 검은 언덕이 보였다. ‘아니 저게 뭐지?’ 버스가 가까이 가자 검은 언덕은 수천 마리의 검은 소들로 변했다. ‘와! 아마 만 마리도 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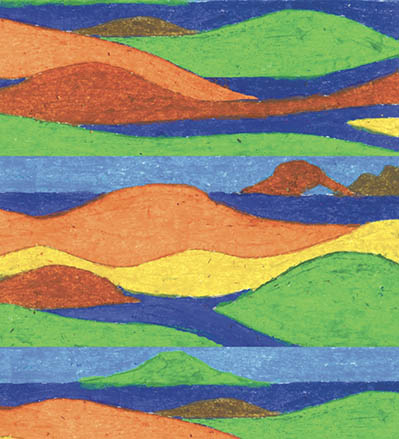 Ik-Joong Kang
Ik-Joong Kang
척 보기에도 버스 승객 대부분은 나처럼 형편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다. 남루한 복장을 한 아저씨가 비닐로 싸인 짐을 좌석 위 선반에 꾹꾹 끼워 넣는다. 앉으면서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냈다. 자신을 사냥꾼이라고 소개한 한 할아버지는 내릴 때쯤 갖고있던 사냥잡지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네브래스카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인디언 일가족이 버스에 오르더니 화장실 옆 맨 뒷자리에 길게 자리를 잡았다. 엄마는 아이들이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계속 나무란다.
유타주의 수도인 솔트레이크를 지날 때는 남학생 한 명이 내 옆에 앉았다. 봄방학이라 부모님이 계시는 새크라멘토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나중에 그곳을 지나게 되면 꼭 자기 집을 방문하라고 하면서 삶은 달걀 두 개를 건내고 버스에서 내렸다. 늦은 저녁 이름 모르는 마을을 지날 때 불 켜진 거실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맞아! 밥을 함께 먹어서 식구라 부르는구나.’
나처럼 무식하게 버스로 미국의 동서를 횡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웬걸 맨 앞에 앉으셔서 뉴욕부터 한 번도 내리지 않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콜로라도주의 작은 마을을 지나자 버스가 텅텅 비었다.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았던 나를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할머니 옆에 앉으니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느냐"라 물으신다. 내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대답하니 의외라고 생각했는지 엄청 놀라셨다.
가지고 간 스케치북을 보여드리니 "원더풀!"을 거듭 외치신다. 할머니는 고향이 보스턴인데, 아직 미국을 구석구석 다녀 본 적이 없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손자를 보러 가는 김에 비행기 대신 버스를 타게 됐다고 하셨다. 연세를 여쭈니 빙그레 웃으며 ‘구십’이라고 한다. 듣고 있던 운전사도 와! 하고 감탄한다. 이때다 싶어 운전사에게 질문했다. “그런데요. 길이 좁은데 큰 버스를 이리 쉽게 운전해요?” 그러자 그는 “하다 보면 알게 돼.”라고 짧게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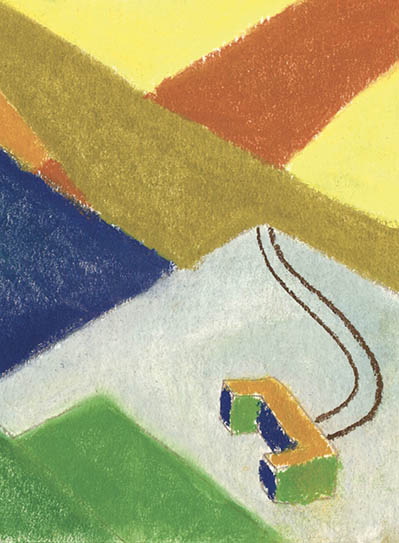 Ik-Joong Kang
Ik-Joong Kang
어쩌면 여행은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버스는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크고 작은 마을을 통과한다. 눈비도 만나고 무지개도 본다. 여러 곳에서 온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버스가 그들에게는 먼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옆에 앉아 같은 창을 바라보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챙겨 들고 각자의 길을 간다. 일상의 모습이 인생의 여행으로 이어지는 장면이다. 다르다면 우리 인생은 떠날 때 짐을 모두 두고 내리는데 말이다.
시애틀까지의 첫 버스 여행 이후 지금까지 차를 몰고 네번 미국을 횡단했다. 모두 서부 지역에서의 작품 전시 때문이었다. 자동차에 작품을 가득 싣고 보통 4박 5일을 달린다. 굳이 운전해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일상에서 잠시 떠나와 낯선 경치를 보며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라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정확히 3천 마일이라는 것과 로키산맥을 넘기 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워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 그 많던 주유소가 높은 산에만 가면 아예 없거나 일찍 문을 닫는다. 작품의 양이 많아서 제법 큰 트럭을 빌려서 몰고 간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큰 트럭이라 복잡한 시내를 통과할 때 겁이 났지만, 그때마다 “하다 보면 알게 돼.”라는 버스 운전사의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다.
어느새 버스가 필라델피아의 차이나타운에 도착했다. 글쓰기를 다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방금 대륙을 달려온 기분이다. 정거장에 내리기 직전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아이고 미안, 강 화백. 내가 지금 뉴욕에 출장 와 있네.”
그때 시애틀에서 만난 여자친구는 그 다음 해에 나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밥을 함께 먹는 식구가 되었다. 그 시절이 생각나 대학생이 된 아들과 버스를 타고 엄마가 살던 시애틀로 다녀올까 해서 인터넷으로 버스요금을 알아봤다. ‘아이고, 그동안 왕복 요금이 무려 8배 이상이 올라 버렸네.’
*강익중씨 런던 템즈강에 '꿈의 섬(Floating Dreams)' 설치
*Inside Korea(The New York Times) Interview
*Artist Ik-Joong Kang’s Chinatown Restaurant Guide
*NY Quotes: 강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