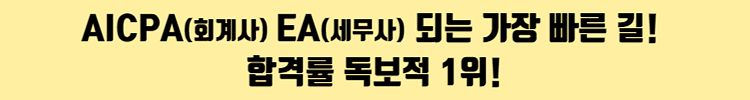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65)
- 강익중/詩 아닌 詩(79)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8)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652) 이영주: 추수감사절과 석류청
뉴욕 촌뜨기의 일기 (64)
추수감사절과 석류청

알을 빼서 설탕에 버무린 석류. 색깔이 너무 예쁘다.
금년 추수감사절은 저에겐 대단한 변이로 왔습니다. 둘째네서 디너를 하기로 했는데, 오기로 했던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 못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어쩔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가져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나니 그것도 일이라고 힘에 부쳐서 도저히 외출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니 둘째가 그러면 내일 상태 봐서 괜찮으면 내일 오라며 만류했습니다. 잘 됐다 싶어 다음날 가기로 하고 몸을 추스리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제 눈에 뜨인 것이 아기 머리통만한 커다란 석류 5개입니다. 추수감사절 음식 시장 보러 갔을 때, 크고 빨갛게 빛나는 석류가 어찌나 탐스럽던지, 참지 못하고 5개를 샀습니다. 마음 같아선 적어도 10개는 사고 싶었지만, 요즘 체력이 떨어진 저에겐 무리다 싶어 그것도 줄여서 5개만 샀던 것입니다. 막상 사긴 했어도 계속 몸상태가 여의치 않아 미루고 있었습니다. 몸이 편치 않아도 며칠동안 부엌에서 기다린 석류를 보니 마음이 더할 수 없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싱싱하고 좋은 식재료를 보면 병자인 제 입장은 잊어버리고 덜컥 사기 일쑤입니다.
두어 시간 후에 전화한 둘째는 둘째 사위가 코로나라는 심란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다행히 둘째와 블루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잡채도 맛있게 만들어 놨는데, 내일 터키 먹으러 갈 일은 자동적으로 취소입니다. 사위 걱정도 되고, 올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큰 액땜을 해주려고 이렇게 넘어가나 싶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땐 일하는 게 상책입니다. 부엌에 가서 석류를 씻고 석류청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석류청 담기까지 두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석류를 쉽게 까려면 위의 튀어나온 부분을 둥글게 도려내고, 밑은 조금 자르고, 세로로 칼집을 내어서 까면 쉽다는 유튜버들의 말대로 하니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알을 빼내는 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알을 까서 동량의 설탕에 비벼놓았다가 좀 녹은 후에 용기에 담고, 위를 설탕을으로 다시 두껍게 덮고 소금도 얄풋하게 덮어 주었습니다. 소금을 덮으면 상할 염려가 없고 맛도 깊어진다고들 합니다.

실패한 매실청은 매실주로. 이건 성공인가, 실패인가. 모르겠다./ 병에 넣었더니 이렇게 뜨고 양도 팍 줄었다./ 모과청. 모과청도 이렇게 떴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주부들은 건강에 좋다는 건강재료로 집에서 많이 장만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그런 식품에 눈을 뜬 것은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농장에서 나는 앵두로 쨈과 술을 만들어주신 게 효시였습니다. 그 전에도 향기좋은 아카시아꽃으로 더러 술을 담기는 했습니다. 가을이면 유자차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그토록 향이 좋거나 달지는 않은 앵두가 잼으로 만드니 너무 색깔이 예쁘고, 은은한 향이 은근히 와닿았습니다. 앵두가 향이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잼에서 나는 향이 너무 신기했고, 술 역시 그 고혹적인 선홍색과 더불어 향까지 입 안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몇 번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 해에 엄마가 그 잼과 술을 이불 보따리에 넣어 보내셔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잼이나 술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것은 딸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입니다. 그전엔 낯선 이민 생활에 바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대학에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블루베리 잼도 만들고, 딸기잼도 가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석류주도 만들어 보고, 매실청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실청은 매실 씨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두번쯤 담고는 그만두었습니다. 매실을 씨채 담글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1년동안 저장하면 씨 안의 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나서 작년에 두 병을 담갔습니다. 올해 1년이 되서 매실청을 딸들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는 것과는 맛의 품격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생선 알러지도 있고, 마늘같은 향신료를 먹으면 소화가 힘든 예민한 위를 가지고 있는데, 매실차를 마시면 그렇게 속이 편하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위가 약한 둘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올 5월에도 정성 들여 매실청 두 병을 담갔는데, 웬일인지 곰팡이가 생겨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원인을 몰라 속상하지만 내년엔 반드시 성공하리라 벼르고 있습니다. 막상 버리다보니 매실이 너무 아까워서 씻어서 술을 담갔습니다. 술도 넉넉지 않아 소주, 와인, 정종까지 짬뽕으로 넣었습니다.

둘째가 좋아하는 잡채. 열심히 만들었지만 갖다 주지 못해 아쉽다. 우리집 잡채는 고기가 안 들어간다. 딸들이 싫어해서.
작년부턴 친구 영선씨가 집에서 딴 모과를 주어서 갖다 주어서 모과청을 만듭니다. 모과가 기침에 좋다고 하니 호흡기질환이라 기침을 많이 하는 제게는 치료약입니다. 올해는 작황이 신통치 않다면서도 그래도 꽤 주셔서 상처난 것 다듬어내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하면 한 점이라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5월이면 매실청, 가을엔 모과와 석류청, 여름에 조선오이가 나오면 또 오이지를 열심히 담급니다. 10년 전, 암 치료 받고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을 때 오직 먹을 수 있었던 게 오이지와 꺳잎 장아치였습니다. 그래서 오이지와 깻잎 장아치는 우리집에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익은 오이지를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무치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석류청 만든 이야기 하다가 옛날 얘기까지 횡설수설 했습니다. 장아치를 만들고 과일청을 만드는 건 제가 먹기 보다는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싫어하는 딸들에게는 “내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해서 입을 다물게 합니다만, 아직도 뭔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다는 게 제겐 기적입니다. 비록 만들고 나선 힘들어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늘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영주/수필가 강원도 철원 생. 중앙대 신문학과 졸업 후 충청일보 정치부 기자와 도서출판 학창사 대표를 지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 1990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후 수필집 '엄마의 요술주머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키울게' '내 인생의 삼중주'를 냈다. 줄리아드 음대 출신 클래식 앙상블 '안 트리오(Ahn Trio)'를 키워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현재 '에세이스트 미국동부지회' 회장이며 뉴욕 중앙일보에 '뉴욕의 맛과 멋' 칼럼을 연재 중이다. '허드슨 문화클럽' 대표로, 뉴저지에서 '수필교실'과 '북클럽'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