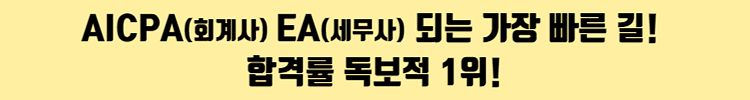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12)
- 강익중/詩 아닌 詩(83)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9)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1)
- 홍영혜/빨간 등대(69)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106) 필 황: 얼마나 빨리 달려가 드릴까요?
택시 블루스 <7> 베스트 드라이버에서 노멀 드라이버로
얼마나 빨리 달려가 드릴까요?

택시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손님들로부터 내 운전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를 자주 들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였고 드물게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초보 때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긍정적 평가의 내용은 주로 (여느 옐로캡과는 달리) 부드럽게 운전한다는 것이다. JFK에서 어느 모녀를 태우고 맨해튼으로 왔는데 내릴 때 중년의 여성 손님은 극찬을 했다.
“우리 딸이 신경이 아주 예민해서 차를 잘 못 타는데 이번에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당신은 내가 겪어본 최고의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손님들은 난폭운전을 하는 옐로캡을 탔던 경험을 얘기하며 내 운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런 칭찬과 격려는 초보 택시기사였던 내게는 큰 격려가 됐다.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을뿐더러 웬만한 노란색 신호에는 차를 세우는 내 모습이 좀 남달라 보였을 것이다. 손님들도 딱히 집어내지는 못해도 뭔가 다르다는 점을 느꼈던 것 같다.
반면 내 운전 스타일을 싫어하는 손님도 있었다. 어느 아랍계 손님은 충고까지 했다.
“이봐 당신 택시 운전수면 택시 운전수답게 운전을 하라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말이야.”
좀 빨리 가달라는 손님들도 있었다. 어차피 막히는 시내에서 좀 빨리 몰아봐야 얼마나 빨리 간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젊은 여자 승객은 나보고 거북이처럼 운전한다고 불평을 했다. 사실 거기엔 사정이 좀 있었다. 당시에 좀 천천히 다니고 노란색 신호에 자주 선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호에 걸린 동안 스마트폰 지도앱으로 행선지와 경로를 확인하고는 했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뉴욕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곤 했던 것이다.

손님이 열차 시간에 쫒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려준다. 어느 중년 아주머니가 너무 늦게 간다고 불만을 쏟아내길래 한번 냅다 달려준 적이 있다. 뭐라 말은 못하지만 하얗게 질린 표정을 백미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예의바른 처자의 경우 5분 내로 펜스테이션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물어오길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날은 최선 이상을 했다. 난폭운전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속도와 대담한 차선 바꾸기를 통해 5분이 안 돼 역까지 데려다 준 것이다.
“아저씨는 뉴욕 최고의 택시 운전수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꽤 운전을 잘 하는 편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운전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손님들이 해 준 얘기 중에서 격려가 됐던 또 다른 표현은 ‘퍼펙트’였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 서행을 하다가 어디 세워달라고 해서 차를 세우면 ‘퍼펙트’라고 얘기하는 손님이 많았다. 나는 내기 실제로 운전을 잘 해서 손님이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세워줬나 보다 생각했다. 나중에야 ‘퍼펙트’는 뉴요커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란 것을 깨달았다. 어쨌든 그런 말들이 초보 운전자에게는 큰 힘이 됐다.
그러던 것이 택시 기사 2년차가 된 이후로 그런 얘기를 듣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만 2년이 가까워지는 요즘에는 내 운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손님이 드물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내 운전이 평범해진 것이다. 다른 옐로캡 드라이버와 비교해 별 다를 것이 없어졌다. 웬만한 시내 지리와 행선지까지의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터라 (지도 찾을 시간을 벌기위해) 굳이 노란색 신호에 맞춰 설 필요가 없고, 교통흐름에 맞게 가급적 빨리 달려주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나도 모르게 평범한 옐로캡 기사가 됐다. 사실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손님이 내 운전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운전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옐로캡업계에 좋은 택시 드라이버는 뉴요커들이 만든다는 얘기가 있다. 워낙 길이 복잡한 곳이 많아 손님들이 길을 운전수에게 가르쳐주며 다녔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요즘에는 GPS가 있어 손님에게 길을 물어볼 일이 거의 없지만 나의 택시 초보시절 손님들의 칭찬과 격려는 한 명의 당당한 뉴욕 옐로캡 드라이버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격언이다.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1960년대 막바지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고 19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486세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독립영화, 광고, 기업홍보 영상, TV 다큐멘터리, 충무로 극영화 등 영상관련 일을 주로 했다. 서른살 즈음 약 1년간의 인도여행을 계기로 정신세계에 눈뜨게 된 이후 정신세계원에서 일하며 동서고금의 정신세계 관련 지식을 섭렵했다.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차 미국에 왔다가 벤처기업에 취업, 뉴욕에 자리를 잡았다. 2010년부터 뉴욕라디오코리아 보도국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여름부터 옐로캡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