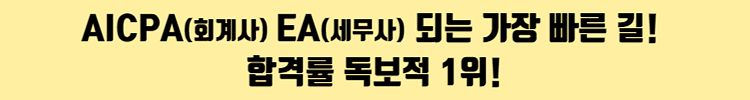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711)
- 강익중/詩 아닌 詩(79)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7)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77) 한혜진: 겨울이 겨울인 이유
에피소드 & 오브제 (13) 겨울 아침에
겨울이 겨울인 이유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단순한 여백으로 돌아갈 때가 필요하다. 잡다한 생각을 잠시 잠재우고…
이럴 때 눈이 오면 안성맞춤이다. 나는 눈밭이 되어버린 세상을 마음껏 걸어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붓을 잡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그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Photo: Hyejin Han
Photo: Hyejin Han
2월의 아침, 모처럼 세상은 눈으로 덮여 있다. 잠든 아이가 덮은 이불처럼, 눈은 대지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눈과 마주한 나는 마치 솜사탕을 손에 넣은 아이처럼 입가에 웃음을 흘린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눈은 선녀님들의 떡가루가 되기도 하고, 솜사탕이 되기도 하고, 연인들의 굳은 약속이 되기도 하는 점이 신기하다. 눈은 오늘 나에게 흰 도화지로 다가온다. 그 여백은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경은 아주 중요하다. 같은 이야기 줄거리라도 어떤 세팅에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배가 되기도 하고, 반감되기도 하는 것이리라. 일본을 열광케 한 ‘욘사마’를 탄생시킨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도, 흰 눈이 없었더라면 그 사랑의 순수성도 그렇게까지는 돋보이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일본 소설 ‘우동 한 그릇’에서도 가족애가 뭉클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눈보라 속을 헤치며 왔다가, 우동 한 그릇 일지언정 사랑을 나누는 세 모자의 따뜻함이 추운 겨울이라는 배경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리라.
뉴욕의 사계절, 눈을 볼 수 있는 겨울이 있음에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따스함에 더욱 감사드리고 싶어진다. 당신에게 안온하게 쉴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식탁 위엔 몸을 덮혀줄 따뜻한 스프와 빵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거라고 누군가 한 말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멀쩡한 팔다리에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널려 있다면 너무 행복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어진다.
오늘, 짖궂은 바람이 눈을 가만 두지 않는다. 눈보라를 일으켜, 창밖은 한창 소용돌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명난 농악대의 상모 돌리기처럼, 눈발은 회오리를 그려내며 내 눈길을 놓치치 않으려 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연의 붓놀림이다. 여백을 메워나가는 눈보라의 붓끝은 때로는 느슨하여 부드럽고, 때로는 날렵하여 매섭게 느껴진다.
그 와중에 내 눈을 점거한 것은, 묵묵히 서 있는 겨울나무들이다. 뿌리가 땅 속에 있는 한, 나뭇가지쯤 흔들려서야 어떠랴, 나뭇잎이 없으면 어떠랴 하고 견디는 모습이다. 나무가 마음이 있다면 말을 할 것인가? 빈 몸이 되어 세상과 맞서는 저 심정을. 옷도 없이 살을 에이는 바람과 스치는 저 쓰라림을. 겨울나무는 말없이 그냥 그렇게 계시는 존재감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어르신네 같다. 누구는 한 때 청춘이 없었겠는가? 따뜻한 봄날에 부플어 오르는 가슴을 가진 적 없었겠는가?
 Photo: Hyejin Han
Photo: Hyejin Han
온 몸을 적시는 빗줄기에 헤매인 적도 있었고, 소슬한 가을 바람에 미소지었던 기억들, 이제는 다 추억의 이름으로 싸매어 한 켠에 두고, 물끄럼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닮고싶은 어르신네 같다. 그 겸허한 자세에서 묻어나는 숭고함은 어떤 비유를 써서 말한다해도 모자랄 것 같다. 세월이 내다 붙인 공고문에서, 배역이 바뀌었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들은 아름답지 않은가? 나무 또한, 그늘을 드리우던 여름을 지내고, 이제는 맨몸으로 눈발도 맞고, 바람을 실감하며, 달갑게 햇볕도 받아들인다. 그리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캔버스 삼아 다시 그림을 그리는 중인지도 모른다.
흰 눈,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로써 재미를 주고, 누군가에겐 순수한 꿈으로 펼쳐지고, 누구에겐 거추장스러운 현실로 미끄럽기만 할 지 모르겠다. 하지만, 겨울 어느 날, 눈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의 귀엣말을 듣는 것처럼 골똘해지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순수와 열정이 차오름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눈 오는 바깥에 문을 벌컥 열고 나가고 싶어진다.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내딛는 발걸음, 눈 위에 찍혀지는 그 발자국만큼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주는 것이 어디 있으리요? 뽀드득 소리를 내며 눈 위에 내 도장이 찍힌다. 발자국은 하얀 눈을 인주 삼아, 눈 위에 나를 찍는다. 눈 위에 찍어보눈 첫 발자국의 마음으로 글을 쓰리라. 그림을 그리리라.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단순한 여백으로 돌아갈 때가 필요하다. 잡다한 생각을 잠시 잠재우고… 이럴 때 눈이 오면 안성맞춤이다. 나는 눈밭이 되어버린 세상을 마음껏 걸어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붓을 잡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그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그 그림 속에 겨울나무처럼 우두커니 서 있고 싶어진다. ‘세상 사는 맛이란 결국 이런 조그만 즐거움의 획득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눈에 겨웁고, 추위에 겨운 날들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제 알 것 같다. 그래서 겨울인 것을.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후 결혼, 1985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한양마트 이사로 일하면서 김정기 시인의 권유로 글쓰기와 연애를 시작, 이민 생활의 균형을 잡기위해 시와 수필을 써왔다. 2011년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마트에 갤러리1&9을 오픈, 한인 작가들을 소개했으며, 롱아일랜드 집 안에 마련한 공방에서 쥬얼리 디자인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