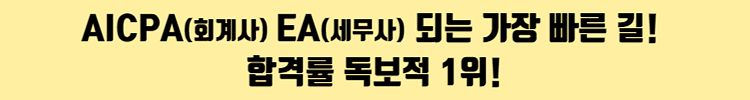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711)
- 강익중/詩 아닌 詩(79)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7)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
2014.03.06 13:13
(4) 한혜진: 미안하다, 사랑한다
조회 수 2694 댓글 4
에피소드 & 오브제(2) 미안하다, 사랑한다
"약한 자여, 나의 이름은 엄마"
“엄마, 나 할 말 있어.”
아들 녀석은 이층에서 내려 오면서 나에게 말을 던졌다. 녀석의 자원봉사 할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기 전이었기에 성질도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녀석은 작정을 한 듯이 보였다.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꺼낸 말은 대체로 담담한 어조였지만, 힘겹게 입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아들 녀석은 이층에서 내려 오면서 나에게 말을 던졌다. 녀석의 자원봉사 할동을 끝내고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기 전이었기에 성질도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녀석은 작정을 한 듯이 보였다. 얼굴이 약간 상기된 채로 꺼낸 말은 대체로 담담한 어조였지만, 힘겹게 입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내용인 즉은 엄마가 이젠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도 말 것이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말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였다. 사실 이말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기특한 말인가. 그런데, 그 때 그 순간에는 난 가슴을 움켜 쥐지는 않았지만, 총 맞은
것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저 눈물이 핑 도는 모습으로 소극적인 대꾸를 할 뿐이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이럴까봐 여태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약속이 있다며 녀석은 휑하니 나가 버렸다. 물을 다 엎지러버린 상황, 저도 아마 사태수습이 어렵다고 느꼈을 테니까…
“울지 마세요. 엄마 이럴까봐 여태까지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약속이 있다며 녀석은 휑하니 나가 버렸다. 물을 다 엎지러버린 상황, 저도 아마 사태수습이 어렵다고 느꼈을 테니까…
나는 암만 곱씹어도 그렇게 말하는 투가 영 납득이 가질 않았었다. 다 저 위해서 한 일 아니던가.
난 그 긴 저녁 시간을 지나며 눈은 점점 퉁퉁 부어 올랐고, 걔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12학년의 9월이라는 스트레스의 시작을 나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 혼자 어떡하라구.. 마침 출장 중인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전화까지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난 그 긴 저녁 시간을 지나며 눈은 점점 퉁퉁 부어 올랐고, 걔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12학년의 9월이라는 스트레스의 시작을 나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 혼자 어떡하라구.. 마침 출장 중인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전화까지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잘 한 일이라 여겨진다. 둘이 궁리한다는 것이 도리어 부모라는 권력으로 아들을 우선 제압할려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몇몇 아는 분들께 전화를 걸어 어안이 벙벙한 사정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 보았다. 학교 카운셀러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던 나의 계획은 “그냥 잠시 내버려 두라”는 어떤 분의 얘기에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다.
곰곰 생각하니 내 속이 들끓었던 것은 아들의 말에서 배반감을 느낀 때문이었다.
여태가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리라. 그만큼 우리 아들은 착하고 온순했다. 아니, 엄마 좋으라고 착하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모습만 보여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차분해지고, 사태에 대한 대응이 명징해졌다. 엄마에게 대들 수 있었디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엄마의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래, 주자. 이젠 줄 때가 되었지.
Give the gift of Independence.
여태가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리라. 그만큼 우리 아들은 착하고 온순했다. 아니, 엄마 좋으라고 착하고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모습만 보여 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차분해지고, 사태에 대한 대응이 명징해졌다. 엄마에게 대들 수 있었디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엄마의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래, 주자. 이젠 줄 때가 되었지.
Give the gift of Independence.
Michelangelo, The Creation of Adam(detail), 1511-1512, Sistine Chaple, Rome
그날 밤, 나는 밤 늦게 들어 온 아들과 마주 앉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다.
그 시간까지 엄마가 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엄마는 네가 한 말을 곰곰히 생각했단다. 그 말에 엄만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기뻐해야 할 말이었어. 왜냐하면 그건 네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 네가 아이의 심정으로는 엄마한테 그런 말 못했을거다. 이제 우리 그런 말 하고 지내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 “엄마는 다 너 좋으라고 한 일이었어. 그런데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그 시간까지 엄마가 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엄마는 네가 한 말을 곰곰히 생각했단다. 그 말에 엄만 처음엔 놀라고 당황했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가 기뻐해야 할 말이었어. 왜냐하면 그건 네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 네가 아이의 심정으로는 엄마한테 그런 말 못했을거다. 이제 우리 그런 말 하고 지내자. 하고 싶은 말 못하면 병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 “엄마는 다 너 좋으라고 한 일이었어. 그런데 네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시원해요.”
얼마나 적절한 한국말 표현인가. 녀석은 감정의 소화불량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아들과의 소통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이리저리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난 정말 몇 년 전 그 일이 있었음에 감사해 한다.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나은 것이다. 이젠 녀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자주 걸지 않아도 그 때 느꼈던 마음으로 나를 다독이곤 한다. 잘 할거라고 믿고 마음 편히 지내는 거다.
얼마나 적절한 한국말 표현인가. 녀석은 감정의 소화불량에서 풀려나고 있었다. 아들과의 소통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이리저리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난 정말 몇 년 전 그 일이 있었음에 감사해 한다.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나은 것이다. 이젠 녀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자주 걸지 않아도 그 때 느꼈던 마음으로 나를 다독이곤 한다. 잘 할거라고 믿고 마음 편히 지내는 거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 몰래 말을 걸고 싶어지는 걸 어쩌랴. “하나님,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 주셔야 해요. 저는 이제 못 합니다. 저 스스로 하겠다는 아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티 나지 않게. 아멘.”
약한 자여, 나의 이름은 엄마다.
연
한혜진
네 몸 한 가운데 남아있는 인연의 자국.
너를 살리려 끊어야 했던 생명선.
내 오늘 그 매듭을 풀어,
튼실한 탯줄로 삼아,
너를 다시 나에게 비끄러매고 싶다.
내 너랑 그리 이별할 줄 알면서도,
네가 그리 아득히 떠나갈 줄 알면서도.
너를 얼르매,
내 마음도 어느덧 창공을 유영한다.
연실을 느슨히 풀어 올림은,
조금 더 높은 세상 올라 보라는 것.
낚시줄마냥 팽팽히 감아내림은,
멀어져가는 너를 아쉬워하는 마음.
연실이, 아니 탯줄이 마구 풀려 나간다.
너의 치닫는 속도에, 그만
급하게 끊어 버린다.
내는 죽어도, 너는 살라고.
내리 꽂히는 한줄기 빛에, 눈을 감는다.
너의 힐끗거리며, 돌아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박힌다.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