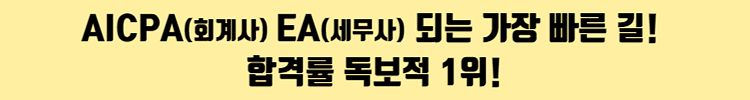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711)
- 강익중/詩 아닌 詩(79)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7)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2) 이영주: 나는 뉴욕 촌뜨기
뉴욕 촌뜨기의 일기 (1)
나는 뉴욕 촌뜨기
서울 사람들이 우리 뉴욕 동포들을 ‘뉴욕 촌뜨기’라고 부릅니다. IT산업의 발달로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면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갑자기 한국의 패션이며 음식이며 문화 허영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동포 사회가 많이 성숙되었지만, 생존경쟁이 치열한 세계의 수도 뉴욕에 살면서 우리 한국 뉴요커들은 사치라든가 허영심에
눈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뉴욕에 왔을 때 기능적인 우리의 작업복 차림이며 소박한 살림살이를
보고 얕은 자부심에 우리를 폄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뉴욕 촌뜨기’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온지 33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김치를 담가 먹고,
멸치 국물을 내서 며칠에 한번씩은 된장국을 끓여 먹으니 말입니다. 녹두전은 통 녹두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기고 직접 갈아서 부쳐
먹고, 만두도 꼭 직접 빚어 먹습니다. 오늘 점심만 해도 오래된 김치를 물에 울궈서 꼭 짜가지고 된장을 조금 넣고 멸치 국물에
오래도록 찜처럼 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반찬 가게가 수없이 많지만 사서 먹는 음식은 왜 그런지 기가 빠진
것처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냉장고에서 묵히다가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촌뜨기 얘기가 먹는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먹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신이 납니다. 그렇지만 뉴욕이 어디 먹는 문화뿐입니까? 세계적인 공연이며 연주며 전시회가 끊이지 않는 곳이 뉴욕이잖습니까?


지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엔 가수 김장훈과 손자 블루네 집에서 빈대떡을 부쳤다.
지난 1월에 서울 갔을 때도 저는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뮤지컬을 두 편이나 보고 왔습니다. 한편은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프랑스 작품입니다. 몇 년 전, 프랑스 제작팀이 한국에 와서 오디션도 보고, 연출도 하고, 무대장치도 똑같이 첨단
기기 사용을 해서 만든 작품으로, 워낙 대본과 음악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앙코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선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왜 공연하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 편은 ‘저지 보이스(Jersey Boys)’라는 미국 뮤지컬입니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뉴저지 출신의 4명의 록앤롤 그룹 ‘포시즌즈(The Four Season)s’의 성공과 추락이 기본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처음 만들어진 후 아직까지도 브로드웨이서 공연 중인데, 그 오리지널 팀이 한국에 와서 마침 공연 중이었습니다.
미국 뮤지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연이 물 흐르듯이 단 일초의 끊김도 없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쉐리(Sherry)’ 등, 귀에 익은 The Four Seasons의 음악도 음악이려니와 처음 공연했던 멤버들의 노래와 춤은
여전히 각이 제대로 서 있었고, 흥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발을 구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지도록 박수를 치고 또 쳤습니다. 서울서 뮤지컬에 제가 초대한 친구들은 제 덕에 모처럼 문화생활 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뉴욕 촌뜨기'라고 말한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은근히 목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뉴욕의 박물관들은 어떻습니까? 규모와 소장품만으로도 기가 죽는 메트로폴리탄뮤지엄과 모마(MoMA)는
가고 또 가도 늘 생경한 것처럼 학습할 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문 박물관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은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입니다. 아예 제 사랑방이라고 찜해 놓았습니다.
화랑들은 또 어떻습니까? 손자 블루가 있는 둘째네 집이 미트팩킹 디스트릭 지역입니다. 하이라인 파크 입구가 한 블록만 가면 있습니다. 첼시도 걸어서 왔다갔다 합니다. 손자 스트롤러를 끌고 생각날 때마다 하이라인 파크며 첼시를 들락거립니다. 한번은 첼시 마켓에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샘플 세일이 있어서 멋진 가죽 쫄바지와 자켓을 사는 횡재도 만났습니다. 박물관이며 화랑은 그러니까 어쩌면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과거의 역사를 되새김질 하는 뿌듯함, 화랑에 가서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현대 작가들의 개성 강한 예술 세계를 눈도장 찍으면서 간만 보는 일도 제게는 크나 큰 창조적인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일이 축복 같고, 그래서 정녕 행복합니다.
뉴욕 촌뜨기가 이렇게 깨소금처럼 맛있게 사는 걸 서울 사람들은 모르니까 겉만 보고 뉴욕 촌뜨기라고 입을 삐죽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년에 뮤지엄엔 몇 번 가냐? 화랑엔 가냐? 오페라나 뮤지컬은 한 편이라도 보냐?
지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파티엔 가수 김장훈이 와서 블루도 봐주고, 빈대떡도 부치고, 서빙까지 하면서 제 일손을
덜어주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파티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하면서 김치 담가 콩나물국 끓여 먹고 사는 뉴욕 촌뜨기. 이 정도면
“뉴욕 촌뜨기 만세!!”, 아닙니까?
*사족: 김장훈씨와 함께 부친 녹두전은 내가 직접 녹두를 갈아서 부친 거죠. 고사리, 도라지, 김치, 돼지고기 넣고요. 다 따로 양념해서
무쳐 놓았다가 놓구 간 담에 한데 섞어서 조그만 동그라미로 구워요. 김장훈씨가 이런 진짜 빈대떡 몇 십년만에 먹는다며 부치면서도
먹고, 무지 먹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빈대떡이라고 다들 부치는대로 먹는 바람에 아주 많이 해도 정작 상에 놓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얘요. 이영주 표 빈대떡, 유명해요. 내 자랑입니다, 하하.
 이영주/수필가
이영주/수필가강원도 철원 생. 중앙대 신문학과 졸업 후 충청일보 정치부 기자와 도서출판 학창사 대표를 지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 1990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후 수필집 '엄마의 요술주머니''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키울게' '내 인생의 삼중주'를 냈다. 줄리아드 음대 출신 클래식 앙상블 '안 트리오(Ahn Trio)'를 키워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현재 뉴욕중앙일보에 '뉴욕의 맛과 멋' 칼럼을 연재 중이며, 뉴저지 AWCA에서 '수필교실'과 '북 클럽'을 지도한다. 또, 매월 세번째 토요일엔 음식을 싸갖고 와 영화 감상 후 토론하는 '예사모' 클럽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