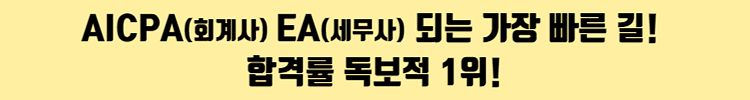- 전체(711)
- 강익중/詩 아닌 詩(79)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5)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97)
- 홍영혜/빨간 등대(66)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5)
필 황/택시 블루스
2015.03.03 02:28
(82) 필 황: 파란만장했던 영업 첫날
조회 수 1780 댓글 5
택시 블루스 <1> 나는야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
파란만장했던 영업 첫 날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이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택시를 운전한 날.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다. 이른 새벽 JFK 공항으로 나가 6시경 첫 손님을 받았다.
긴장됐다. 손님을 맞이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이 손님이 어디로 가자고 할까? 내가 모르는 곳을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지? 공항에서 손님을 받을 때의 두근거림은 이후로도 며칠이나 갔다.
다행히 60대말이나 70대초로 보이는 인상좋은 남성이 탔다. 팔십 몇가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로 가자고 하는데 어딘 지 모르겠다. 당황스러웠다. 트라이보로 브릿지를 넘어가면 된다고 손님이 알려준다. 나는 아이폰에 탑재된 구글맵으로 위치를 대충 찍어 차를 출발했다.
공항 내 고속도로를 달려 나가는 순간 손님이 물었다.
“시내까지는 정액요금(flat rate)이 아닌가요?”
그 소리를 듣고 택시미터를 보니 허걱! 일반요금으로 미터기를 조작한 것이다. 지금 같으면 여유롭게 미터기를 종료하고 52달러 정액요금으로 다시 찍었겠지만, 당시만 해도 미터기 조작이 서투른데다 당황해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정액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터기에 요금이 어떻게 나오든 정액요금만 받겠습니다.”
첫날 첫 운행부터 실수였다. 운전을 하며 손님과 대화를 나눴다.
“오늘이 저의 첫 택시 운전이며, 선생님이 제 생애 첫 승객이십니다.”
그 손님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이런저런 격려의 말과 함께 행운을 빌어주었다.
GPS와 손님의 길안내를 받아가며 무사히 첫 운행을 마쳤다. 미터 요금도 다행히 정액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손님은 내게 80달러를 건냈다. 정상적이라면 미터 요금은 톨비와 세금을 포함해 57달러 83센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20달러가 넘는 금액을 팁으로 준 것이다. 내 첫 손님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다.

택시 운전 첫날, 나의 첫 손님은 팁을 20여달러 주었다. Photo: Phil Hwang
첫 출발이 좋다.
손님을 내려주고 웨스트엔드(West End) 애브뉴를 따라 내려왔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길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이 차를 세웠다. 푸른색 간호복을 입고 있었다. 귀여운 인상이었는데 중국계인 듯 했다.
168가에 있는 뉴욕소아병원을 가자고 했다. 당연히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하는 지도 몰랐다. GPS에 주소를 찍으려고 하니 그냥 헨리 헛슨 파크웨이(Henry Hudson Pkwy)를 타고 가면 된다고 급하니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고속도로로 어떻게 진입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럼 길을 안내해줘요. 내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그녀는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그녀를 믿은 것이 실수였다. 79가에서 우회전해 고속도로 진입로로 접근하는 순간 그녀가 뒤에서 갑자기 외쳤다.
“아뇨! 이쪽 오른쪽으로요!”
차는 북측 진입로를 막 지나쳐 남측 진입로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어디가 북측 진입로고 어디가 남측 진입로인지 몰랐다.
급히 속도를 줄이며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충격이 왔다. 뒤따라오던 밴과 충돌한 것이다. 눈앞이 캄캄했다. 첫날 두 번째 운행만에 사고를 내다니. 최악이었다.

첫날 마지막 손님 Photo: Phil Hwang
나는 차에서 내렸다. 뒤차 운전수는 4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다. 제과점 배달 차량인지 짐칸에는 빵 상자가 쓰러져 빵이 흩어져 있었다. 노란색 뉴저지 번호판이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사실 지금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든 뒤에서 받은 차량에 과실이 더 많다.)
다행히 그리고 놀랍게도 두 차량의 데미지는 크지 않았다. 택시의 뒤쪽 범퍼는 이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밴 차량의 앞쪽 범퍼가 조금 찌그러져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및 충돌부위 사진을 찍고 운전면허증과 차량보험증도 서로 교환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손으로 직접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부르지 않았다. 뒤차 운전수도 침착하고 온화했다.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다.
간호사 손님은 바쁘다며 택시 요금을 내고 사라졌다. 손님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면 도망간다는 것을 이후에도 여러 번 경험했다. 택시 운전은 고스란히 택시 운전수의 몫인 것이다. 만약 조금만 더 사고가 컸더라면 나는 그날로 택시운전을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액땜을 한 것이다.
그날 그 이후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마지막 손님의 사진까지 찍었다. 첫날 첫 손님과 마지막 손님의 사진이 남아 있을 뿐...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1960년대 막바지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고 19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486세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독립영화, 광고, 기업홍보 영상, TV 다큐멘터리, 충무로 극영화 등 영상관련 일을 주로 했다. 서른살 즈음 약 1년간의 인도여행을 계기로 정신세계에 눈뜨게 된 이후 정신세계원에서 일하며 동서고금의 정신세계 관련 지식을 섭렵했다.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차 미국에 왔다가 벤처기업에 취업, 뉴욕에 자리를 잡았다. 2010년부터 뉴욕라디오코리아 보도국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여름부터 옐로캡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다.